⊙ “《한서》, 《사기》보다 훨씬 정확하고 풍부… 사마천이 이야기꾼이라면, 반고는 역사가”
⊙ “역사를 읽는 것은 事理를 배우는 것”
⊙ “역사를 읽는 것은 事理를 배우는 것”
⊙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쇠망의 길 연 漢元帝와 비슷”
⊙“지금은 조선 성종 때와 비슷… 기득권 시스템 유연화하면서 中興하지 못하면 쇠락”
⊙“이명박·박근혜 때 中興 위한 솔선수범 못 하고 탐욕적으로 굴러갔기 때문에 우파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것”
-

- 사진=조준우
《월간조선》에 ‘시사와 역사로 주역을 읽다-以事讀易’을 연재하고 있는 이한우(李翰雨·59) 논어등반학교 교장(전 《조선일보》 문화부장)이 새 책을 냈다. 중국 기전체(紀傳體) 사서(史書)의 최고봉(最高峰)으로 평가받는 반고(班固·AD 32~92)의 《한서(漢書)》(전 10권)를 번역한 것이다.
《전한서(前漢書)》라고도 하는 《한서》는 고조(高祖)의 유방(劉邦·BC 247~195)부터 왕망(王莽·BC 45~AD 23)의 신(新·AD 8~23)나라에 이르기까지 230여 년에 걸친 전한(前漢·BC 202~AD 8)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제기’(帝紀·황제의 치세) 12편, ‘표’(表·연표 등) 8편, ‘지’(志·제도, 문화, 지리, 경제, 사상 등) 10편, ‘열전’(列傳·인물전) 70편 등 총 100편 120권으로 되어 있다.
기존에 《한서》 번역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서》의 일부인 열전을 발췌해서 번역한 것이거나, 표는 번역하지 않은 것이었다. 국내에서 《한서》를 전부 번역[완역·完譯]한 것은 이 책이 최초인 셈이다. 번역서에 대해서는 평가가 인색한 풍토이기는 하지만, 《한서》 완역은 우리 시대의 커다란 문화적 성취라고 생각해 이한우 교장을 만났다.
“《漢書》는 經과 史가 겸비된 史書”
― 《한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중국 사람에게 《한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잘 모르겠고, 번역된 《한서》를 읽을 한국 사람한테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우리가 앞으로 중국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려면, 먼저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큰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좌·우(左·右)를 떠나서 한국 사람이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서를 고른다면 어떤 책을 골라야 할까요? 중국에서 여러 개 왕조가 이어져왔지만, 중국의 모태(母胎)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차이나(China)’라는 나라 이름이 진(秦)나라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모태로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최초의 거대 제국인 한(漢)나라일 것입니다. 《한서》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한우 교장은 “《한서》는 사서(史書)의 가치 측면에서도 중국 24사(史) 가운데 가장 탁월한 책”이라고 덧붙였다.
― 우리나라에서는 《한서》 완역이 최초인 것으로 아는데,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980년대에 《한서》가 번역되었는데, 일본에도 24사 가운데 완역된 것이 사마천(司馬遷·BC 145~86경)의 《사기(史記)》와 《한서》뿐입니다. 《당서(唐書)》도 안 나와 있어요. 이 책을 번역하게 된 데에는 ‘일본이 그 정도 했으니 우리도 《한서》 완역본 정도는 가져야겠다’ 하는 약간의 의무감도 작용했습니다.”
이한우 교장은 “일본 번역서에 비해 적어도 두 가지는 개선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서》는 역사서지만 사실은 그 밑에 경학[經學·《논어(論語)》 《맹자(孟子)》 《대학(大學)》 《중용(中庸)》 등에 대한 학문]이 깔려 있어요. 경(經)과 사(史)가 겸비된 사서(史書)인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 번역된 《한서》는 원로 역사학자가 번역한 것이다 보니 경학 부분에서 오역(誤譯)과 오류(誤謬)가 많아요. 제가 경(經)을 공부한 것이 이 책을 번역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문장정종》 번역하다 《한서》에 매혹돼”
― 다른 하나는 뭔가요.
“《한서》는 고한문(古漢文)인데, 고한문의 핵심은 ‘함축’입니다. 따라서 함축된 언어를 그대로 표현한 후 그에 대한 풀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나온 《한서》 번역본은 당나라 때 안사고(顔師古·581~645)라는 학자가 《한서》를 풀이해놓은 것을 번역한 것이었어요. 반고의 《한서》가 아니라 안사고 버전의 《한서》를 번역한 셈이죠.”
― 두 책이 많이 다른가요.
“글을 읽는 맛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그렇지만, ‘아래 하(下)’ 자 뒤에 지명(地名)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부산(下釜山)’하는 식으로…. 한나라 때 ‘하’라는 글자에는 말 그대로 ‘떨어뜨리다’, 즉 ‘함락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하부산’이라고 하면 ‘부산을 함락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 당나라 때의 ‘하(下)’자 용법이 한나라 때와 달랐다는 것인데, 안사고는 그 점을 자신의 책에서 밝혀놓았나요.
“안사고는 당연히 그 점을 철저하게 밝혀놓았지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 《한서》를 번역하면서 이런 부분을 전부 생략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한서》는 드라이하고 읽는 맛이 없어요. 저는 《한서》에 나오는 고한문의 용법에 따라 번역해 원래 맛을 살렸습니다.”
― 《한서》는 어떻게 해서 번역하게 됐습니까.
“송(宋)나라 때 학자 진덕수(眞德秀·1178~1235)가 중국의 여러 책에서 좋은 문장을 뽑아놓은 《문장정종(文章正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보니 실린 글 가운데 4분의 1이 《한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뽑은 문장보다 더 많았어요. 그걸 보고서 ‘아, 진덕수는 《한서》의 문장을 최고(最高)로 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장정종》 속에 실린 《한서》의 문장을 읽다 보니 《한서》에 매혹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또 사마천의 《사기》와 반고의 《한서》는 모두 한나라 초기 역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역사가 겹치는 부분에 대한 진덕수의 평가를 보니, 《한서》에 대한 평가가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2015년 중반부터 《한서》 번역에 들어가 2018년에 마쳤습니다.”
古今人表
― 2018년에 번역을 마쳤는데, 책이 이제야 나온 이유는 뭡니까.
“교열을 한 번 보는 데 4개월씩 걸렸거든요. 교열을 세 번 봤습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나간 거지요.”
― 국내에서 《한서》 완역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전을 발췌·번역한 게 두 종(種) 있더군요. 완역본이라고 나온 게 하나 있기는 한데, 그것은 표가 빠졌으니 완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번역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눈에 많이 띄고요….”
― ‘표’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표는 기전체 사서에서 핵심입니다. 전(傳·인물전)은 재미있지만 그것만 내버려두면 모래알처럼 날아다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골격인 기(紀)만 갖고는 책이 드라이해집니다. 전과 기 사이에서 중간 고리 역할을 하면서 양자를 종횡(縱橫)으로 묶어주는 게 표입니다.
《한서》에는 모두 10개의 표가 있는데, 그중 다른 기전체 사서에는 없고 반고의 《한서》에만 있는 표가 있어요.”
― 그게 뭡니까.
“‘고금인표(古今人表)’라는 것입니다. 역대 인물들을 ‘상상(上上)·상중(上中)·상하(上下)’ 하는 식으로 모두 9등급으로 나누어 표로 만든 것이죠. 이 분류가 정확하냐에 대해서는 이견(異見)이 있겠지만, 반고라고 하는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 우리나라에서 열전을 비롯해 《사기》는 그나마 많이 번역된 반면에 《한서》가 덜 알려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독서 수준하고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독서 수준이라는 게 《이문열 삼국지》에서 맴도는 수준 아니에요? 《사기》를 읽었다고 해도 일종의 희한한 이야깃거리로서 《사기열전》인 것이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의식을 갖고 《사기》를 읽은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자, 역사 쓸 수 있는 원칙 제시”
― 사마천과 반고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사마천이 인간의 이야기들을 국가에서부터 인사, 경제, 문화, 사회생활, 토목 등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으로 담아내는 기전체라는 체제를 만들어낸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역사를 쓴다는 게 무엇인가’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기록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척도에서 보면 반고가 훨씬 뛰어나다고 봅니다.”
― 반고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반고가 철저하게 공자(孔子) 정신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마천에게도 공자가 《춘추(春秋)》를 쓴 이후 500년 만에 그 연장선상에서 《사기》를 쓴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하지만 사마천은 유가적(儒家的)인 면이 있지만, 도가(道家)에 대해서도 열려 있었지요. 반면에 반고는 정통 유가이자 사가(史家) 집안 출신으로 그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진 전문가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공자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흔히 공자를 ‘도덕교사’라고 생각하지만, 공자의 가장 위대한 점은 역사를 쓸 수 있는 원칙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 그 ‘원칙’이 뭔가요.
“사리(事理), 즉 예(禮)입니다. 여기서 예라고 함은 예법(禮法) 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리라는 기준이 있어야 역사 서술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가 입장에서 중국 역사를 쓴 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 안 되겠죠.
“‘떠나자’는 입장을 가진 도가에서는 역사를 쓸 수 없어요. 역사는 기본적으로 세속(世俗)이니까. 탈(脫)세속 가지고 역사를 쓸 수 있겠어요? 불교는 어떨까요. 불교 입장에서 불교사(佛敎史)는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는 쓸 수 없을 것입니다. 《한서》와 《사기》를 번역하면서 공자의 역사가로서 면모를 보게 되었어요.”
사마천과 반고
― 반고의 《한서》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가 유교적 입장에 철저하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고 내용적으로도 《사기》보다 훨씬 정확하고 풍부합니다. 중국에서는 ‘사마천이 일가(一家)를 이루고 싶은 욕심에 글에다 멋을 부리느라고 실상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고 평가합니다. 그 오류를 반고가 많이 바로잡았습니다. 사마천이 이야기꾼이라면 반고는 말 그대로 진짜 역사 저술가라고 할까요.
또한 철저하게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문장을 모델로 한 반고는 문체(文體)가 단아합니다. 반면 사마천은 성격이 격정적이다 보니 글에서도 그런 면이 나타납니다. 중국 송나라 때 문인인 양만리(楊萬里·1127~1206)는 사마천을 이백(李白), 반고를 두보(杜甫)에 비유했는데, 공감이 갑니다.”
― 반고와 사마천의 그런 차이는, 반고는 유교가 관학(官學) 이데올로기로 정립된 후의 사람인 반면 사마천은 그 이전 사람이기 때문 아닐까요.
“물론이죠. 사마천이 살던 시기는 한무제(漢武帝·BC 156~87) 때인데, 바로 동중서(董仲舒·BC 176~104경)가 사상적 통일을 시도한 때였죠. 사마천은 그 이전 시대를 살아온, 일종의 ‘사상의 자유시장’이 있던 때의 사람입니다. 반고는 전한(前漢) 시대가 지나가고 난 후인 후한(後漢) 때 사람이었죠. 후한은 광무제(光武帝·BC 6~AD 57) 자신이 유생(儒生)이고, 반고가 살던 시대의 황제인 명제(明帝·28~75)도 유학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마천과 반고의 역사 서술에는 개인적 캐릭터뿐 아니라 시대적 성격도 작용했겠죠.”
태종과 세종의 대화
― 조선시대 역사에서 경연(經筵)에 등장하는 책을 보면, 사서(史書)보다는 경서(經書)에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적으로 성리학(性理學) 때문이죠. 조선 초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성리학이 그렇게 지배적이 아니었을 때에도 신하들은 기본적으로 임금이 경(經)을 읽기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라’는 것이죠. 반면에 임금은 사(史)를 읽고 싶어 합니다. 역사는 권도(權道)거든요.”
― 재미있네요.
“세종이 얼마나 영리한가 하면 말이죠, 세종은 임금이 되자마자 경연에서 연속으로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읽었습니다. 송나라 진덕수가 지은 《대학연의》는 중국의 역사적 사실들을 가지고 《대학》을 풀이한, 경(經)과 사(史)가 통합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타협책인 거죠. ‘너희가 나에게 경(經)을 읽으라고 하는데, 《대학연의》에는 경(經)도 있고 사(史)도 있다’는 것인데, 사실 세종의 마음은 사(史)에 있던 거죠.
그게 강한 임금들이 갖고 있는 훌륭한 특성입니다. 조선 중기 이후로 가면 사서를 읽는 임금은 거의 보기 어려워집니다.”
― 저도 경(經)보다 사(史)가 더 재미있습니다.
“당연하죠. 사실 조선 초에 《한서》는 이미 식자(識者)들의 필독서였어요. 실록을 보면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황희(黃喜)를 다시 불러다 쓰라’고 하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황희는 사단(師丹·?~3)이다.’ 그러자 세종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죠. 이는 두 사람이 사단을 모르면 오갈 수 없는 대화죠.”
― 사단이 누구인가요.
“한나라 원제(元帝·BC 75~33)에서 성제(成帝·BC 51~7)로 넘어가는 시기의 인물인데, 성제의 스승이었습니다. 원래 원제는 성제가 태자 시절에 잘못을 많이 저지르자 그를 폐(廢)하려고 했어요. 그때 사단이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그러자 원제는 ‘사단은 내가 마음을 바꾸기를 기대하고 태자를 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해요. 그렇게 해서 성제가 마음을 돌리면 사단은 태자(성제)에게 영웅이 될 테니까요.”
― 황희가 양녕대군을 폐하는 것을 반대했을 때, 태종도 황희에게 그런 의심을 품었죠.
“바로 그겁니다. 원제는 나중에 사단이 그런 잔머리로 하는 말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사단을 중용합니다. 태종과 세종 모두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기에 두 사람의 대화는 너무 짧습니다. ‘황희는 사단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죠.
리더들 간의 대화는 이래야 합니다. 미주알고주알할 필요가 없어요.”
“線을 지키라는 것이 《한서》의 교훈”
― 《한서》 속 인물 중에서 인상적인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고조 유방이죠. 유방과 그를 중심으로 한 인물 군상(群像)…. 우리는 장량(張良·?~BC 186)이나 소하(蕭何·?~BC 193)가 유방의 무한(無限) 총애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서》를 보면 두 사람이 조심조심하다가 조용히 물러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아무리 (최고 권력자와) 가까운 것 같아도 선(線)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한서》는 일관되게 그 길을 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언(諫言)을 해도 정도껏 하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한문제(漢文帝) 때의 신하인 원앙(袁盎·?~?)입니다. 원앙이 직언극간(直言極諫)하는 성격인데,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반고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 싶은 게, 그는 원앙을 곧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면서도 ‘불경불식(不經不式)’이라고 평합니다.”
―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 사람을 자기 마음의 원칙이나 행동의 모범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직언극간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반고는 달랐어요.”
― 저도 어렸을 때는 역사책을 보면서 직언극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훌륭하게 여겼는데, 요즘 들어서는 적당하게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언극간하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게 바로 《한서》 같은 책을 읽지 않아서 생긴 폐단입니다. 《한서》 같은 책을 일찍 읽었다면 우리는 훨씬 깊은 안목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한서열전》에서 공로를 세워 영달한 인물의 후손들이 불초(不肖)해서 집안 망치는 얘기를 보면 재벌 3, 4세들이 회사 말아먹는 게 떠오르더군요.
“짤막짤막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표(表)를 보면 그런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표가 주는 재미 중 하나가 인생무상(人生無常)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바로 ‘경(敬·삼감)’입니다. 삼가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자식을 비명횡사(非命橫死)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歷史觀보다 중요한 게 事理”
― 옛날에 나온 책이든지 요즘 나온 책이든지 간에 중국 역사책들을 보면 역사에서 교훈을 도출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느껴지곤 합니다. 이것도 성리학의 영향 때문일까요.
“그보다는 우리가 서양 역사에 익숙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물론 너무 유치하게 교훈에 집착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역사를 읽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배우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그게 아까 말한 사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넓게 보아서 그때나 지금이나 관통하는 사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쓸 수 있는 지적(知的)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관(歷史觀) 운운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사리 같아요. 사리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옛날 얘기 백날 써놓으면 뭐 하겠어요?”
이한우 교장은 “그런 점에서 중국인들이 사리에 입각해 역사를 쓰려고 한 것은 대단하다”고 평했다.
“그런데 중국에도 《한서》 이후에는 그만한 역사서가 없어요. 《후한서》하고 《신당서》를 조금 봤는데, 《한서》를 보다가 그걸 보니 격이 떨어져서 못 보겠더라고요. 인간 군상이 살아가는 모습을 리얼하게 그리면서도 정확하게 이치로 포착하고 평가해낸 게 《한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끊임없이 《한서》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한우 교장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기록을 위해 내가 미리 얘기해놓으려는 것인데, 《조선왕조실록》의 한문 수준은 어느 정도일 것 같으냐”고 물었다.
― 어느 정도입니까.
“한마디로 ‘필리핀 영어’.”
― 어이쿠!
“역시 네이티브(native)하고 다른 게, 중국 한문에 담긴 아주 묘한 뉘앙스를 따라가지 못해요. 내가 《태종실록》 《한서》도 번역했는데, 《실록》에는 글이 주는 짜릿함이 없어요. 그저 의미만 전달하는 정도라고 할까.”
元帝와 (문재인)
― 혹시 《한서》 속 인물들 중에 오늘날 인물하고 비교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라든지….
“문 대통령은 원제(元帝)하고 비슷하죠. 아무것도 안 한 임금. 원제가 처가인 왕씨 집안에 흔들리고, 태자를 잘못 정하는 바람에 한나라가 쇠퇴하다가 결국 왕망(王莽)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 그렇죠.
“왕망의 신나라를 사이에 두고 전한(前漢)과 후한(後漢)이 각각 200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와 조선이 500년을 갔지만, 중국은 보통 한 왕조가 200년 정도 이어졌어요. 큰 시야에서 보면 국가라는 게 200년쯤 가다가 없어지는 것이 정상 같아요.”
― 왜 그렇습니까.
“국가가 형성되면 기득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조선이 건국한 지 70년쯤 지난 성종(成宗) 때하고 비슷한데, 이 정도 시간이 흐르면 기득권 시스템을 유연화(柔軟化)하는 데 실패하는 것 같아요. 중국도 비슷하고…. 모빌리티를 못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역사를 보면 그걸 고치는 것이 쉽지 않고 결국 나라가 한 번 엎어져야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무서운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도 그런 문제잖아요. 망해서 탈락해 있는 70~80% 국민은 나라도 필요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좌파(左派)는 그들을 선동(煽動)해서 몰고 가는 거죠. 우파(右派)는 거기에 대고 자꾸 원론적(原論的)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자본주의가 어떻고 하니까 그 사람들 화만 돋우는 거고….
이 문제를 우파도 좀 거시적(巨視的)인 시각으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깊은 고민을 할 때 진짜 보수주의(保守主義)의 원칙부터 해서 활로(活路)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조적으로 소외(疏外)돼버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고민을 깊이 해야 할 거예요.”
“우파, 시대적 과제 놓쳐”
― 그렇다고 좌파가 내놓은 것은 답이 아니죠.
“그건 답이 아니라 선동이죠. 영국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 같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共同體) 전체를 보존하는 것을 먼저 중시하되, 그 안에서 조금 유연해질 필요가 있어요.
공자를 비롯해서 중국인들이 역사를 쓸 때 중시한 게 ‘중흥(中興)’의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모빌리티를 활성화하는 것이죠. 사실 우파가 이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하던 시기가 이명박(李明博)·박근혜(朴槿惠) 때였습니다. 그때 탐욕적으로 굴러갔기 때문에, 지금 벌 받고 있는 겁니다.”
― 맞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정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건 이명박·박근혜 탓이라기보다는 우파가 시대적 과제를 놓쳤을 때 좌파가 파고든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런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권력이나 잡아보자고 하는데, 그렇게 권력 잡아서는 또 빼앗긴다고….”
― 저도 이명박·박근혜 때 뭐를 했기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됐나 하는 생각이 들면 잠이 안 옵니다.
“시대적 책무(責務)를 하지 않고, 권력을 향유(享有)한 결과예요.”
― 이명박 정권은 경제 면에서는 제법 볼 만한 업적이 있었지만, 정권 참여자들이 이(利)를 너무 좇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익(利益) 정권이었지요.”
이한우 교장은 지난 20년 동안 자신의 저술은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2001~2007년 《군주열전》 쓸 때는 노무현(盧武鉉) 정권 시기잖아요. 리더십 부재(不在)의 시대에 리더십을 모색해보기 위해 《군주열전》을 쓴 거죠. 이명박 정권 시기인 2007~2012년 《논어》를 공부한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公)의 붕괴, 사(私)만 있고 공(公)은 없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계속 있기 때문이었어요.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2~2017년에는 《태종실록》 등을 통해 유능함의 문제를 고민해왔고….”
“禮를 모르는 사람은 비명횡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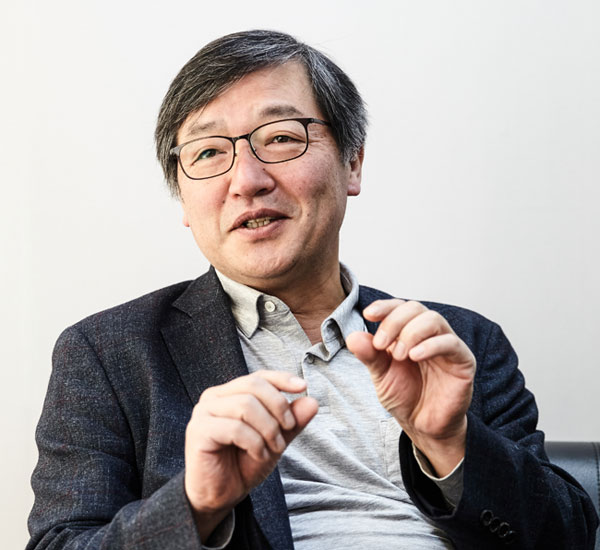
―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모든 게 동시에 다 붕괴돼버렸어요. 파당적(派黨的)이고 탐욕적이고, 공(公)도 없고, 리더십은 당연히 없고…. 이 모든 게 이 정부에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데, 나라가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 정권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옛날에 어른들이 ‘염치(廉恥)를 알라’고 하던 게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중(管仲)이 말한 예의염치(禮義廉恥) 사유(四維)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게 바로 사리입니다. 공자는 ‘예(禮)를 모르는 사람은 비명횡사한다(不知禮者 非命橫死)’고 했는데, 이는 조국(曺國)이 명백하게 보여줬잖아요.”
― 거리낌 없이 가짜 뉴스를 쏟아내는 좌파도 염치가 없지만, 이른바 ‘우파 유튜버’라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여기에는 여야(與野)도 없고, 좌우도 없어요.”
― 미래통합당의 공천(公薦)을 보면 공(公)도 없고, 시대적 책무에 대한 고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여줬으면 사람들이 감동했을 텐데…. 사실은 양쪽 다 희망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 아사리판에서 작은 이익을 보려고 미친 듯이 설쳐대고 하니까, 뜻있는 사람들은 참여하기를 꺼리는 거고….”
― 많은 사람이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을 보존할 수 있는 교두보(橋頭堡)를 만드는 기회가 되기 바랐는데, 실력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작은 이익을 추구하려다가 그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린 게 아닌가 싶어 속상합니다.
“다 생각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역사에 침잠(沈潛)하는 거죠. 2000년을 도망가서….”
― 그러면 뭐가 좀 보이는 게 있습니까.
“중국의 경우 보통 한 왕조에서 임금이 20명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괜찮은 임금은 보통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면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끝났으니) 우리는 다 지나간 거야, 지나갔다고….”
― 아이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당나라 봐요. 제대로 한 사람은 당 태종(598~649) 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한나라(전한)는 많지. 유방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경제(景帝·BC 188~141)도 대단했어요. ‘문경치세(文景治世)’라고 하잖아요. 무제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영토의 틀을 만든 사람이고…. 선제(宣帝·BC 73~49)도 비교적 통치를 잘했어요.”
― 그러고 보니 전한은 성적이 괜찮네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후한(後漢)은 광무제와 명제 두 사람을 지나면 바로 내리막길이었어요. 매번 좋은 리더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역사를 통해 체념하는 법도 보고 배워야 해요. 그러면서도 ‘중흥의 과제’라는 것을 생각해야죠. 산소호흡기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우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정도 중흥해놓으면 50년 정도는 그 약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의 중흥 군주는 영·정조 아닌 숙종”
― 지금까지 쓴 책이 몇 권이나 됩니까.
“번역한 책이 70권, 지은 책이 20권 정도.”
― 하루하루 쫓기는 일간지 기자를 하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데스크(부장)가 되기 전까지는 (저술의 바탕이 되는) 다독(多讀)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신 한 해 좋은 책을 하나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평기자 때는 한 해 영어나 독일어 철학책을 번역하려 노력했습니다.”
― 번역도 사실상 저술 아닙니까.
“번역은 제게 좋은 지적(知的) 훈련방법이었어요. 저술할 때는 모르는 건 그냥 지나가도 되지만, 번역할 때는 모른다고 지나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 풀고 가야지. 그 푸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많았어요. 번역이 제게는 지적 훈련의 원천이었어요.”
― 데스크도 할 일이 많은데, 데스크가 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저술은 더 어렵지 않았나요.
“사실 일간지 데스크는 오후 4시까지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겸사겸사 책을 보면서 그때부터 저술이 본격화된 거죠. 물론 《조선일보》가 잘 포용해줬고….”
― 그동안 번역한 책 중 제일 의미 있게 생각하는 책은 뭡니까.
“역시 《한서》죠. 《한서》는 그동안 제가 공부한 것의 총화(總和)입니다. 아마 앞으로 이만한 책은 또 번역하지 못할 것 같아요.”
― 저술한 책 중에서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책은 뭔가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군주열전》이죠.”
― 《군주열전》은 조선시대 임금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시각을 많이 보여줬죠. 저는 그중에서 태종과 숙종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핵심이죠. 제가 볼 때에는 숙종이 조선의 중흥군주예요. 흔히 영·정조 시대를 조선의 중흥기라고 보는 것은 완전 허구입니다. 중흥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 영·정조 때가 중흥기라면, 정조 사후(死後) 순조 때부터 바로 나라가 거꾸러지는 게 설명이 안 되죠.
“맞아요. ‘숙종이 중흥해놓은 에너지를 영조와 정조가 말아먹는 바람에 순조 때부터 고꾸라졌다’, 이래야 설명이 되죠.”
‘공자의 자유로운 정신’
이한우 교장의 페이스북에는 ‘공자의 자유로운 정신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기를!’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유학(儒學)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으로 보면 언뜻 이해가 안 간다.
― ‘공자의 자유로운 정신’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유학이라고 할 때 먼저 떠올리는 성리학(주자학)과 공자의 유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자가 중시하는 것은 틀, 상도(常道)가 아니고 권도(權道)입니다. 권도를 발휘하려면 우선 전제가 되는 게 자기 수양과 자기 단련입니다. 자율(自律)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흔히 생각하는 서구적 의미의 ‘자유’와는 차이가 있어요. 자기 수양이 되어서 세상의 이치를 알 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공자와는 달리, 성리학은 교조(敎條)를 가지고 집단화하고 인간을 얽어맸죠. 지금 우리 사회의 좌파가 굉장히 성리학적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은 거죠.”
― 자유 하면 서구적 개념의 자유가 먼저 떠오르죠.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자, 보세요. ‘자유’라고 할 때 ‘자(自)’하고 ‘유(由)’ 자는 원래 뜻이 똑같아요. 영어로 ‘from’ 즉 ‘~로부터 말미암다’는 뜻입니다. ‘자’라는 글자에는 ‘나 자신’이라는 의미도 있지요. 모든 것은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내가 사유(思惟)할 줄 알아야 하고, 내가 행동할 줄 알아야 하고, 내가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나’는 이기적(利己的)인 ‘나’가 아니라 공적인 책임의식을 자신의 것으로 떠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의 말과 행동이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조선은 주자학 탈레반 국가”
10여 년 전 한동안 산업화-민주화 다음에는 선진화라는 말이 유행했다. 산업화를 바탕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냈으니,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선진국을 만들자는 말이었다. 요즘은 산업화-민주화 다음에 조선화(朝鮮化)라는 말이 돌고 있다.
― 산업화-민주화-조선화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하하하, 맞네. 조선화! 후기(後期) 조선화!”
― 《조선왕조실록》을 여러 번 읽고 조선시대에 대한 책도 많이 쓴 입장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봅니까.
“조선은 고려를 딛고 일어섰지만, 총체적으로 비교할 때는 고려가 훨씬 더 건강했죠. 사상적으로는 유교와 불교가 병존(竝存)했고, 문무겸전(文武兼全)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이었잖아요. 반면에 조선은 지정학적(地政學的) 위치하고 명(明)나라 때문이기는 했지만, 지나치게 내부 지향적인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태종이 중앙집권을 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지방의 다양성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 면도 있고요. 국가는 원심력(遠心力)과 구심력(求心力)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조선은 지나치게 구심력을 작동시킨 다음에 그 구심력의 핵심을 신하들이 장악하면서 활력을 잃어버렸어요. 큰 외침(外侵)을 적게 당해 500년간 존속하기는 했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는 200년 이상은 주자학 탈레반 국가였어요. 그것은 굉장히 괴기스럽고, 건강하지 못한 거였죠. 조선 초엔 안 그랬는데….”
― 국가 권력의 필요에 의해, 일단의 교조적 지식인들에 의해, 국가의 틀이 그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게 무섭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굉장히 섬뜩하고, 사실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인 거죠.”
“한명회·유자광 평전 쓰고 싶어”
― 논어등반학교는 잘되고 있습니까.
“2016년부터 했으니 이제 만 4년 됐죠. 2016~2018년에는 1년에 2기(期)씩 하다가 작년부터는 1년에 한 기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8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습니다. 《논어》를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급반인 《대학연의》 강독반과 《주역》 강독반도 하고 있습니다.”
― 수강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논어》는 작년까지 약 150명이었고, 《대학연의》는 10명, 《주역》은 17명이 듣고 있습니다.”
― 주로 어떤 사람들이 들으러 오나요.
“회사원, 의사, 대학교수, 변호사, 판사, 자기 회사 운영하는 사람 등 다양합니다.”
― 지금 번역하고 있는 《사기》는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본기는 마쳤고, 표하고 세가(世家·제후 왕의 전기)를 번역하는 중입니다. 《한서》와는 달리 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표, 세가, 서(序), 열전을 순차적으로 낼 계획입니다. 내년에 내 손을 떠나면 2022년쯤 책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 페이스북을 보니 주석(註釋)을 많이 달았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았습니다. 본기만 해도 기존에 번역된 것들은 300페이지인데 제가 번역한 것은 《논어로 논어를 풀다》(1404쪽)보다 조금 더 두껍더군요.”
― 왜 그렇게 주석을 많이 달았습니까.
“일반 독자는 물론 앞으로 한문공부할 사람들까지 염두에 두고 《사기》에 대한 아주 미세한 주(註)까지 다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역사공부가 철저해야 한다는 것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라도 100% 주(註)를 가진 책을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 그다음에는 무슨 일을 할 계획입니까.
“12권까지 번역을 끝낸 《태종실록》을 총 21권으로 마치고 나면, 한명회(韓明澮·1415~1487)의 스승인 유방선(柳方善·1388~1443)부터 시작해 한명회·유자광(柳子光·1439~1512), 명재상 이준경(李浚慶·1499~1572) 등을 통해 조선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전한서(前漢書)》라고도 하는 《한서》는 고조(高祖)의 유방(劉邦·BC 247~195)부터 왕망(王莽·BC 45~AD 23)의 신(新·AD 8~23)나라에 이르기까지 230여 년에 걸친 전한(前漢·BC 202~AD 8)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제기’(帝紀·황제의 치세) 12편, ‘표’(表·연표 등) 8편, ‘지’(志·제도, 문화, 지리, 경제, 사상 등) 10편, ‘열전’(列傳·인물전) 70편 등 총 100편 120권으로 되어 있다.
기존에 《한서》 번역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서》의 일부인 열전을 발췌해서 번역한 것이거나, 표는 번역하지 않은 것이었다. 국내에서 《한서》를 전부 번역[완역·完譯]한 것은 이 책이 최초인 셈이다. 번역서에 대해서는 평가가 인색한 풍토이기는 하지만, 《한서》 완역은 우리 시대의 커다란 문화적 성취라고 생각해 이한우 교장을 만났다.
“《漢書》는 經과 史가 겸비된 史書”
 |
| 이한우 논어등반학교장이 번역한 《한서》(전 10권). |
“중국 사람에게 《한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잘 모르겠고, 번역된 《한서》를 읽을 한국 사람한테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우리가 앞으로 중국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려면, 먼저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큰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좌·우(左·右)를 떠나서 한국 사람이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서를 고른다면 어떤 책을 골라야 할까요? 중국에서 여러 개 왕조가 이어져왔지만, 중국의 모태(母胎)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차이나(China)’라는 나라 이름이 진(秦)나라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모태로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최초의 거대 제국인 한(漢)나라일 것입니다. 《한서》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한우 교장은 “《한서》는 사서(史書)의 가치 측면에서도 중국 24사(史) 가운데 가장 탁월한 책”이라고 덧붙였다.
― 우리나라에서는 《한서》 완역이 최초인 것으로 아는데,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980년대에 《한서》가 번역되었는데, 일본에도 24사 가운데 완역된 것이 사마천(司馬遷·BC 145~86경)의 《사기(史記)》와 《한서》뿐입니다. 《당서(唐書)》도 안 나와 있어요. 이 책을 번역하게 된 데에는 ‘일본이 그 정도 했으니 우리도 《한서》 완역본 정도는 가져야겠다’ 하는 약간의 의무감도 작용했습니다.”
이한우 교장은 “일본 번역서에 비해 적어도 두 가지는 개선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서》는 역사서지만 사실은 그 밑에 경학[經學·《논어(論語)》 《맹자(孟子)》 《대학(大學)》 《중용(中庸)》 등에 대한 학문]이 깔려 있어요. 경(經)과 사(史)가 겸비된 사서(史書)인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 번역된 《한서》는 원로 역사학자가 번역한 것이다 보니 경학 부분에서 오역(誤譯)과 오류(誤謬)가 많아요. 제가 경(經)을 공부한 것이 이 책을 번역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문장정종》 번역하다 《한서》에 매혹돼”
 |
| 《문장정종》 《대학연의》를 지은 진덕수. |
“《한서》는 고한문(古漢文)인데, 고한문의 핵심은 ‘함축’입니다. 따라서 함축된 언어를 그대로 표현한 후 그에 대한 풀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나온 《한서》 번역본은 당나라 때 안사고(顔師古·581~645)라는 학자가 《한서》를 풀이해놓은 것을 번역한 것이었어요. 반고의 《한서》가 아니라 안사고 버전의 《한서》를 번역한 셈이죠.”
― 두 책이 많이 다른가요.
“글을 읽는 맛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그렇지만, ‘아래 하(下)’ 자 뒤에 지명(地名)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부산(下釜山)’하는 식으로…. 한나라 때 ‘하’라는 글자에는 말 그대로 ‘떨어뜨리다’, 즉 ‘함락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하부산’이라고 하면 ‘부산을 함락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 당나라 때의 ‘하(下)’자 용법이 한나라 때와 달랐다는 것인데, 안사고는 그 점을 자신의 책에서 밝혀놓았나요.
“안사고는 당연히 그 점을 철저하게 밝혀놓았지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 《한서》를 번역하면서 이런 부분을 전부 생략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한서》는 드라이하고 읽는 맛이 없어요. 저는 《한서》에 나오는 고한문의 용법에 따라 번역해 원래 맛을 살렸습니다.”
― 《한서》는 어떻게 해서 번역하게 됐습니까.
“송(宋)나라 때 학자 진덕수(眞德秀·1178~1235)가 중국의 여러 책에서 좋은 문장을 뽑아놓은 《문장정종(文章正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보니 실린 글 가운데 4분의 1이 《한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뽑은 문장보다 더 많았어요. 그걸 보고서 ‘아, 진덕수는 《한서》의 문장을 최고(最高)로 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장정종》 속에 실린 《한서》의 문장을 읽다 보니 《한서》에 매혹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또 사마천의 《사기》와 반고의 《한서》는 모두 한나라 초기 역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역사가 겹치는 부분에 대한 진덕수의 평가를 보니, 《한서》에 대한 평가가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2015년 중반부터 《한서》 번역에 들어가 2018년에 마쳤습니다.”
古今人表
― 2018년에 번역을 마쳤는데, 책이 이제야 나온 이유는 뭡니까.
“교열을 한 번 보는 데 4개월씩 걸렸거든요. 교열을 세 번 봤습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나간 거지요.”
― 국내에서 《한서》 완역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전을 발췌·번역한 게 두 종(種) 있더군요. 완역본이라고 나온 게 하나 있기는 한데, 그것은 표가 빠졌으니 완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번역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눈에 많이 띄고요….”
― ‘표’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표는 기전체 사서에서 핵심입니다. 전(傳·인물전)은 재미있지만 그것만 내버려두면 모래알처럼 날아다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골격인 기(紀)만 갖고는 책이 드라이해집니다. 전과 기 사이에서 중간 고리 역할을 하면서 양자를 종횡(縱橫)으로 묶어주는 게 표입니다.
《한서》에는 모두 10개의 표가 있는데, 그중 다른 기전체 사서에는 없고 반고의 《한서》에만 있는 표가 있어요.”
― 그게 뭡니까.
“‘고금인표(古今人表)’라는 것입니다. 역대 인물들을 ‘상상(上上)·상중(上中)·상하(上下)’ 하는 식으로 모두 9등급으로 나누어 표로 만든 것이죠. 이 분류가 정확하냐에 대해서는 이견(異見)이 있겠지만, 반고라고 하는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 우리나라에서 열전을 비롯해 《사기》는 그나마 많이 번역된 반면에 《한서》가 덜 알려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독서 수준하고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독서 수준이라는 게 《이문열 삼국지》에서 맴도는 수준 아니에요? 《사기》를 읽었다고 해도 일종의 희한한 이야깃거리로서 《사기열전》인 것이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의식을 갖고 《사기》를 읽은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자, 역사 쓸 수 있는 원칙 제시”
 |
| 사마천. |
“사마천이 인간의 이야기들을 국가에서부터 인사, 경제, 문화, 사회생활, 토목 등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으로 담아내는 기전체라는 체제를 만들어낸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역사를 쓴다는 게 무엇인가’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기록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척도에서 보면 반고가 훨씬 뛰어나다고 봅니다.”
― 반고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반고가 철저하게 공자(孔子) 정신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마천에게도 공자가 《춘추(春秋)》를 쓴 이후 500년 만에 그 연장선상에서 《사기》를 쓴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하지만 사마천은 유가적(儒家的)인 면이 있지만, 도가(道家)에 대해서도 열려 있었지요. 반면에 반고는 정통 유가이자 사가(史家) 집안 출신으로 그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진 전문가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공자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흔히 공자를 ‘도덕교사’라고 생각하지만, 공자의 가장 위대한 점은 역사를 쓸 수 있는 원칙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 그 ‘원칙’이 뭔가요.
“사리(事理), 즉 예(禮)입니다. 여기서 예라고 함은 예법(禮法) 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리라는 기준이 있어야 역사 서술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가 입장에서 중국 역사를 쓴 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 안 되겠죠.
“‘떠나자’는 입장을 가진 도가에서는 역사를 쓸 수 없어요. 역사는 기본적으로 세속(世俗)이니까. 탈(脫)세속 가지고 역사를 쓸 수 있겠어요? 불교는 어떨까요. 불교 입장에서 불교사(佛敎史)는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는 쓸 수 없을 것입니다. 《한서》와 《사기》를 번역하면서 공자의 역사가로서 면모를 보게 되었어요.”
사마천과 반고
반고. |
“그런 것만은 아니고 내용적으로도 《사기》보다 훨씬 정확하고 풍부합니다. 중국에서는 ‘사마천이 일가(一家)를 이루고 싶은 욕심에 글에다 멋을 부리느라고 실상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고 평가합니다. 그 오류를 반고가 많이 바로잡았습니다. 사마천이 이야기꾼이라면 반고는 말 그대로 진짜 역사 저술가라고 할까요.
또한 철저하게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문장을 모델로 한 반고는 문체(文體)가 단아합니다. 반면 사마천은 성격이 격정적이다 보니 글에서도 그런 면이 나타납니다. 중국 송나라 때 문인인 양만리(楊萬里·1127~1206)는 사마천을 이백(李白), 반고를 두보(杜甫)에 비유했는데, 공감이 갑니다.”
― 반고와 사마천의 그런 차이는, 반고는 유교가 관학(官學) 이데올로기로 정립된 후의 사람인 반면 사마천은 그 이전 사람이기 때문 아닐까요.
“물론이죠. 사마천이 살던 시기는 한무제(漢武帝·BC 156~87) 때인데, 바로 동중서(董仲舒·BC 176~104경)가 사상적 통일을 시도한 때였죠. 사마천은 그 이전 시대를 살아온, 일종의 ‘사상의 자유시장’이 있던 때의 사람입니다. 반고는 전한(前漢) 시대가 지나가고 난 후인 후한(後漢) 때 사람이었죠. 후한은 광무제(光武帝·BC 6~AD 57) 자신이 유생(儒生)이고, 반고가 살던 시대의 황제인 명제(明帝·28~75)도 유학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마천과 반고의 역사 서술에는 개인적 캐릭터뿐 아니라 시대적 성격도 작용했겠죠.”
태종과 세종의 대화
― 조선시대 역사에서 경연(經筵)에 등장하는 책을 보면, 사서(史書)보다는 경서(經書)에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적으로 성리학(性理學) 때문이죠. 조선 초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성리학이 그렇게 지배적이 아니었을 때에도 신하들은 기본적으로 임금이 경(經)을 읽기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라’는 것이죠. 반면에 임금은 사(史)를 읽고 싶어 합니다. 역사는 권도(權道)거든요.”
― 재미있네요.
“세종이 얼마나 영리한가 하면 말이죠, 세종은 임금이 되자마자 경연에서 연속으로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읽었습니다. 송나라 진덕수가 지은 《대학연의》는 중국의 역사적 사실들을 가지고 《대학》을 풀이한, 경(經)과 사(史)가 통합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타협책인 거죠. ‘너희가 나에게 경(經)을 읽으라고 하는데, 《대학연의》에는 경(經)도 있고 사(史)도 있다’는 것인데, 사실 세종의 마음은 사(史)에 있던 거죠.
그게 강한 임금들이 갖고 있는 훌륭한 특성입니다. 조선 중기 이후로 가면 사서를 읽는 임금은 거의 보기 어려워집니다.”
― 저도 경(經)보다 사(史)가 더 재미있습니다.
“당연하죠. 사실 조선 초에 《한서》는 이미 식자(識者)들의 필독서였어요. 실록을 보면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황희(黃喜)를 다시 불러다 쓰라’고 하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황희는 사단(師丹·?~3)이다.’ 그러자 세종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죠. 이는 두 사람이 사단을 모르면 오갈 수 없는 대화죠.”
― 사단이 누구인가요.
“한나라 원제(元帝·BC 75~33)에서 성제(成帝·BC 51~7)로 넘어가는 시기의 인물인데, 성제의 스승이었습니다. 원래 원제는 성제가 태자 시절에 잘못을 많이 저지르자 그를 폐(廢)하려고 했어요. 그때 사단이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그러자 원제는 ‘사단은 내가 마음을 바꾸기를 기대하고 태자를 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해요. 그렇게 해서 성제가 마음을 돌리면 사단은 태자(성제)에게 영웅이 될 테니까요.”
― 황희가 양녕대군을 폐하는 것을 반대했을 때, 태종도 황희에게 그런 의심을 품었죠.
“바로 그겁니다. 원제는 나중에 사단이 그런 잔머리로 하는 말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사단을 중용합니다. 태종과 세종 모두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기에 두 사람의 대화는 너무 짧습니다. ‘황희는 사단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죠.
리더들 간의 대화는 이래야 합니다. 미주알고주알할 필요가 없어요.”
“線을 지키라는 것이 《한서》의 교훈”
 |
| 장량. |
“당연히 고조 유방이죠. 유방과 그를 중심으로 한 인물 군상(群像)…. 우리는 장량(張良·?~BC 186)이나 소하(蕭何·?~BC 193)가 유방의 무한(無限) 총애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서》를 보면 두 사람이 조심조심하다가 조용히 물러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아무리 (최고 권력자와) 가까운 것 같아도 선(線)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한서》는 일관되게 그 길을 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언(諫言)을 해도 정도껏 하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한문제(漢文帝) 때의 신하인 원앙(袁盎·?~?)입니다. 원앙이 직언극간(直言極諫)하는 성격인데,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반고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 싶은 게, 그는 원앙을 곧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면서도 ‘불경불식(不經不式)’이라고 평합니다.”
―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 사람을 자기 마음의 원칙이나 행동의 모범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직언극간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반고는 달랐어요.”
 |
| 소하. |
“직언극간하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게 바로 《한서》 같은 책을 읽지 않아서 생긴 폐단입니다. 《한서》 같은 책을 일찍 읽었다면 우리는 훨씬 깊은 안목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한서열전》에서 공로를 세워 영달한 인물의 후손들이 불초(不肖)해서 집안 망치는 얘기를 보면 재벌 3, 4세들이 회사 말아먹는 게 떠오르더군요.
“짤막짤막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표(表)를 보면 그런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표가 주는 재미 중 하나가 인생무상(人生無常)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바로 ‘경(敬·삼감)’입니다. 삼가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자식을 비명횡사(非命橫死)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歷史觀보다 중요한 게 事理”
― 옛날에 나온 책이든지 요즘 나온 책이든지 간에 중국 역사책들을 보면 역사에서 교훈을 도출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느껴지곤 합니다. 이것도 성리학의 영향 때문일까요.
“그보다는 우리가 서양 역사에 익숙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물론 너무 유치하게 교훈에 집착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역사를 읽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배우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그게 아까 말한 사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넓게 보아서 그때나 지금이나 관통하는 사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쓸 수 있는 지적(知的)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관(歷史觀) 운운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사리 같아요. 사리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옛날 얘기 백날 써놓으면 뭐 하겠어요?”
이한우 교장은 “그런 점에서 중국인들이 사리에 입각해 역사를 쓰려고 한 것은 대단하다”고 평했다.
“그런데 중국에도 《한서》 이후에는 그만한 역사서가 없어요. 《후한서》하고 《신당서》를 조금 봤는데, 《한서》를 보다가 그걸 보니 격이 떨어져서 못 보겠더라고요. 인간 군상이 살아가는 모습을 리얼하게 그리면서도 정확하게 이치로 포착하고 평가해낸 게 《한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끊임없이 《한서》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한우 교장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기록을 위해 내가 미리 얘기해놓으려는 것인데, 《조선왕조실록》의 한문 수준은 어느 정도일 것 같으냐”고 물었다.
― 어느 정도입니까.
“한마디로 ‘필리핀 영어’.”
― 어이쿠!
“역시 네이티브(native)하고 다른 게, 중국 한문에 담긴 아주 묘한 뉘앙스를 따라가지 못해요. 내가 《태종실록》 《한서》도 번역했는데, 《실록》에는 글이 주는 짜릿함이 없어요. 그저 의미만 전달하는 정도라고 할까.”
元帝와 (문재인)
― 혹시 《한서》 속 인물들 중에 오늘날 인물하고 비교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라든지….
“문 대통령은 원제(元帝)하고 비슷하죠. 아무것도 안 한 임금. 원제가 처가인 왕씨 집안에 흔들리고, 태자를 잘못 정하는 바람에 한나라가 쇠퇴하다가 결국 왕망(王莽)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 그렇죠.
“왕망의 신나라를 사이에 두고 전한(前漢)과 후한(後漢)이 각각 200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와 조선이 500년을 갔지만, 중국은 보통 한 왕조가 200년 정도 이어졌어요. 큰 시야에서 보면 국가라는 게 200년쯤 가다가 없어지는 것이 정상 같아요.”
― 왜 그렇습니까.
“국가가 형성되면 기득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조선이 건국한 지 70년쯤 지난 성종(成宗) 때하고 비슷한데, 이 정도 시간이 흐르면 기득권 시스템을 유연화(柔軟化)하는 데 실패하는 것 같아요. 중국도 비슷하고…. 모빌리티를 못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역사를 보면 그걸 고치는 것이 쉽지 않고 결국 나라가 한 번 엎어져야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무서운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도 그런 문제잖아요. 망해서 탈락해 있는 70~80% 국민은 나라도 필요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좌파(左派)는 그들을 선동(煽動)해서 몰고 가는 거죠. 우파(右派)는 거기에 대고 자꾸 원론적(原論的)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자본주의가 어떻고 하니까 그 사람들 화만 돋우는 거고….
이 문제를 우파도 좀 거시적(巨視的)인 시각으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깊은 고민을 할 때 진짜 보수주의(保守主義)의 원칙부터 해서 활로(活路)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조적으로 소외(疏外)돼버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고민을 깊이 해야 할 거예요.”
“우파, 시대적 과제 놓쳐”
― 그렇다고 좌파가 내놓은 것은 답이 아니죠.
“그건 답이 아니라 선동이죠. 영국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 같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共同體) 전체를 보존하는 것을 먼저 중시하되, 그 안에서 조금 유연해질 필요가 있어요.
공자를 비롯해서 중국인들이 역사를 쓸 때 중시한 게 ‘중흥(中興)’의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모빌리티를 활성화하는 것이죠. 사실 우파가 이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하던 시기가 이명박(李明博)·박근혜(朴槿惠) 때였습니다. 그때 탐욕적으로 굴러갔기 때문에, 지금 벌 받고 있는 겁니다.”
― 맞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정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건 이명박·박근혜 탓이라기보다는 우파가 시대적 과제를 놓쳤을 때 좌파가 파고든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런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권력이나 잡아보자고 하는데, 그렇게 권력 잡아서는 또 빼앗긴다고….”
― 저도 이명박·박근혜 때 뭐를 했기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됐나 하는 생각이 들면 잠이 안 옵니다.
“시대적 책무(責務)를 하지 않고, 권력을 향유(享有)한 결과예요.”
― 이명박 정권은 경제 면에서는 제법 볼 만한 업적이 있었지만, 정권 참여자들이 이(利)를 너무 좇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익(利益) 정권이었지요.”
이한우 교장은 지난 20년 동안 자신의 저술은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2001~2007년 《군주열전》 쓸 때는 노무현(盧武鉉) 정권 시기잖아요. 리더십 부재(不在)의 시대에 리더십을 모색해보기 위해 《군주열전》을 쓴 거죠. 이명박 정권 시기인 2007~2012년 《논어》를 공부한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公)의 붕괴, 사(私)만 있고 공(公)은 없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계속 있기 때문이었어요.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2~2017년에는 《태종실록》 등을 통해 유능함의 문제를 고민해왔고….”
“禮를 모르는 사람은 비명횡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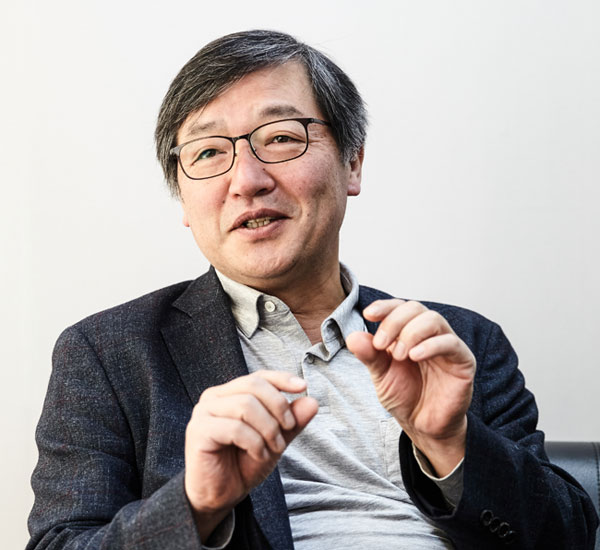
―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모든 게 동시에 다 붕괴돼버렸어요. 파당적(派黨的)이고 탐욕적이고, 공(公)도 없고, 리더십은 당연히 없고…. 이 모든 게 이 정부에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데, 나라가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 정권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옛날에 어른들이 ‘염치(廉恥)를 알라’고 하던 게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중(管仲)이 말한 예의염치(禮義廉恥) 사유(四維)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게 바로 사리입니다. 공자는 ‘예(禮)를 모르는 사람은 비명횡사한다(不知禮者 非命橫死)’고 했는데, 이는 조국(曺國)이 명백하게 보여줬잖아요.”
― 거리낌 없이 가짜 뉴스를 쏟아내는 좌파도 염치가 없지만, 이른바 ‘우파 유튜버’라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여기에는 여야(與野)도 없고, 좌우도 없어요.”
― 미래통합당의 공천(公薦)을 보면 공(公)도 없고, 시대적 책무에 대한 고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여줬으면 사람들이 감동했을 텐데…. 사실은 양쪽 다 희망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 아사리판에서 작은 이익을 보려고 미친 듯이 설쳐대고 하니까, 뜻있는 사람들은 참여하기를 꺼리는 거고….”
― 많은 사람이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을 보존할 수 있는 교두보(橋頭堡)를 만드는 기회가 되기 바랐는데, 실력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작은 이익을 추구하려다가 그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린 게 아닌가 싶어 속상합니다.
“다 생각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역사에 침잠(沈潛)하는 거죠. 2000년을 도망가서….”
― 그러면 뭐가 좀 보이는 게 있습니까.
“중국의 경우 보통 한 왕조에서 임금이 20명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괜찮은 임금은 보통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면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끝났으니) 우리는 다 지나간 거야, 지나갔다고….”
― 아이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당나라 봐요. 제대로 한 사람은 당 태종(598~649) 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한나라(전한)는 많지. 유방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경제(景帝·BC 188~141)도 대단했어요. ‘문경치세(文景治世)’라고 하잖아요. 무제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영토의 틀을 만든 사람이고…. 선제(宣帝·BC 73~49)도 비교적 통치를 잘했어요.”
― 그러고 보니 전한은 성적이 괜찮네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후한(後漢)은 광무제와 명제 두 사람을 지나면 바로 내리막길이었어요. 매번 좋은 리더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역사를 통해 체념하는 법도 보고 배워야 해요. 그러면서도 ‘중흥의 과제’라는 것을 생각해야죠. 산소호흡기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우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정도 중흥해놓으면 50년 정도는 그 약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의 중흥 군주는 영·정조 아닌 숙종”
― 지금까지 쓴 책이 몇 권이나 됩니까.
“번역한 책이 70권, 지은 책이 20권 정도.”
― 하루하루 쫓기는 일간지 기자를 하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데스크(부장)가 되기 전까지는 (저술의 바탕이 되는) 다독(多讀)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신 한 해 좋은 책을 하나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평기자 때는 한 해 영어나 독일어 철학책을 번역하려 노력했습니다.”
― 번역도 사실상 저술 아닙니까.
“번역은 제게 좋은 지적(知的) 훈련방법이었어요. 저술할 때는 모르는 건 그냥 지나가도 되지만, 번역할 때는 모른다고 지나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 풀고 가야지. 그 푸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많았어요. 번역이 제게는 지적 훈련의 원천이었어요.”
― 데스크도 할 일이 많은데, 데스크가 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저술은 더 어렵지 않았나요.
“사실 일간지 데스크는 오후 4시까지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겸사겸사 책을 보면서 그때부터 저술이 본격화된 거죠. 물론 《조선일보》가 잘 포용해줬고….”
― 그동안 번역한 책 중 제일 의미 있게 생각하는 책은 뭡니까.
“역시 《한서》죠. 《한서》는 그동안 제가 공부한 것의 총화(總和)입니다. 아마 앞으로 이만한 책은 또 번역하지 못할 것 같아요.”
― 저술한 책 중에서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책은 뭔가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군주열전》이죠.”
― 《군주열전》은 조선시대 임금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시각을 많이 보여줬죠. 저는 그중에서 태종과 숙종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핵심이죠. 제가 볼 때에는 숙종이 조선의 중흥군주예요. 흔히 영·정조 시대를 조선의 중흥기라고 보는 것은 완전 허구입니다. 중흥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 영·정조 때가 중흥기라면, 정조 사후(死後) 순조 때부터 바로 나라가 거꾸러지는 게 설명이 안 되죠.
“맞아요. ‘숙종이 중흥해놓은 에너지를 영조와 정조가 말아먹는 바람에 순조 때부터 고꾸라졌다’, 이래야 설명이 되죠.”
‘공자의 자유로운 정신’
 |
| 공자. |
― ‘공자의 자유로운 정신’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유학이라고 할 때 먼저 떠올리는 성리학(주자학)과 공자의 유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자가 중시하는 것은 틀, 상도(常道)가 아니고 권도(權道)입니다. 권도를 발휘하려면 우선 전제가 되는 게 자기 수양과 자기 단련입니다. 자율(自律)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흔히 생각하는 서구적 의미의 ‘자유’와는 차이가 있어요. 자기 수양이 되어서 세상의 이치를 알 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공자와는 달리, 성리학은 교조(敎條)를 가지고 집단화하고 인간을 얽어맸죠. 지금 우리 사회의 좌파가 굉장히 성리학적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은 거죠.”
― 자유 하면 서구적 개념의 자유가 먼저 떠오르죠.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자, 보세요. ‘자유’라고 할 때 ‘자(自)’하고 ‘유(由)’ 자는 원래 뜻이 똑같아요. 영어로 ‘from’ 즉 ‘~로부터 말미암다’는 뜻입니다. ‘자’라는 글자에는 ‘나 자신’이라는 의미도 있지요. 모든 것은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내가 사유(思惟)할 줄 알아야 하고, 내가 행동할 줄 알아야 하고, 내가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나’는 이기적(利己的)인 ‘나’가 아니라 공적인 책임의식을 자신의 것으로 떠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의 말과 행동이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조선은 주자학 탈레반 국가”
10여 년 전 한동안 산업화-민주화 다음에는 선진화라는 말이 유행했다. 산업화를 바탕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냈으니,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선진국을 만들자는 말이었다. 요즘은 산업화-민주화 다음에 조선화(朝鮮化)라는 말이 돌고 있다.
― 산업화-민주화-조선화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하하하, 맞네. 조선화! 후기(後期) 조선화!”
― 《조선왕조실록》을 여러 번 읽고 조선시대에 대한 책도 많이 쓴 입장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봅니까.
“조선은 고려를 딛고 일어섰지만, 총체적으로 비교할 때는 고려가 훨씬 더 건강했죠. 사상적으로는 유교와 불교가 병존(竝存)했고, 문무겸전(文武兼全)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이었잖아요. 반면에 조선은 지정학적(地政學的) 위치하고 명(明)나라 때문이기는 했지만, 지나치게 내부 지향적인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태종이 중앙집권을 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지방의 다양성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 면도 있고요. 국가는 원심력(遠心力)과 구심력(求心力)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조선은 지나치게 구심력을 작동시킨 다음에 그 구심력의 핵심을 신하들이 장악하면서 활력을 잃어버렸어요. 큰 외침(外侵)을 적게 당해 500년간 존속하기는 했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는 200년 이상은 주자학 탈레반 국가였어요. 그것은 굉장히 괴기스럽고, 건강하지 못한 거였죠. 조선 초엔 안 그랬는데….”
― 국가 권력의 필요에 의해, 일단의 교조적 지식인들에 의해, 국가의 틀이 그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게 무섭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굉장히 섬뜩하고, 사실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인 거죠.”
“한명회·유자광 평전 쓰고 싶어”
 |
| 논어등반학교는 지난 4년 동안 8기에 걸쳐 150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
“2016년부터 했으니 이제 만 4년 됐죠. 2016~2018년에는 1년에 2기(期)씩 하다가 작년부터는 1년에 한 기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8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습니다. 《논어》를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급반인 《대학연의》 강독반과 《주역》 강독반도 하고 있습니다.”
― 수강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논어》는 작년까지 약 150명이었고, 《대학연의》는 10명, 《주역》은 17명이 듣고 있습니다.”
― 주로 어떤 사람들이 들으러 오나요.
“회사원, 의사, 대학교수, 변호사, 판사, 자기 회사 운영하는 사람 등 다양합니다.”
― 지금 번역하고 있는 《사기》는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본기는 마쳤고, 표하고 세가(世家·제후 왕의 전기)를 번역하는 중입니다. 《한서》와는 달리 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표, 세가, 서(序), 열전을 순차적으로 낼 계획입니다. 내년에 내 손을 떠나면 2022년쯤 책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 페이스북을 보니 주석(註釋)을 많이 달았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았습니다. 본기만 해도 기존에 번역된 것들은 300페이지인데 제가 번역한 것은 《논어로 논어를 풀다》(1404쪽)보다 조금 더 두껍더군요.”
― 왜 그렇게 주석을 많이 달았습니까.
“일반 독자는 물론 앞으로 한문공부할 사람들까지 염두에 두고 《사기》에 대한 아주 미세한 주(註)까지 다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역사공부가 철저해야 한다는 것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라도 100% 주(註)를 가진 책을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 그다음에는 무슨 일을 할 계획입니까.
“12권까지 번역을 끝낸 《태종실록》을 총 21권으로 마치고 나면, 한명회(韓明澮·1415~1487)의 스승인 유방선(柳方善·1388~1443)부터 시작해 한명회·유자광(柳子光·1439~1512), 명재상 이준경(李浚慶·1499~1572) 등을 통해 조선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